김파란 ㅣ 농민
스물아홉. 나는 영세한 공장의 현장 노동자가 되었다. 첫 출근, 아무런 교육도 없이 작업장으로 투입되었다. 조립반, 도장반, 가공반(프레스반)로 나누어진 공장에서 나는 가공반으로 갔다. 300톤, 500톤…. 프레스들이 금형틀에 끼워져 있는 철들을 탕탕 내리찍는 고막을 찢을듯한 소음에 작업을 지시하는 현장 반장의 목소리는 묻혔고, 출근한지 한 시간이 되지 않은 나는 목장갑만을 손에 끼고 알곤 용접기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노동자로서 산업안전교육, 즉 법으로 정해진 위험작업자 작업 배치 전 16시간 교육, 안전보호장비의 지급도 받지 못했지만, 모든 서류에 교육을 받았고 보호장비를 지급 받았다 싸인을 했다. 모든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하는 도장반의 경우는 50대의 여성 근로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유기용제의 냄새에 지속적인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독성 화학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2배 이상 높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한국의 산재사망자 수에 사람들은 어떤 공포와 경각심도 없다. 그런 죽음에 노출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즉 인간의 생존을 위한 물적 기반이 되는 부의 불평등이 생명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가 가난을 관념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가난에서 오는 고통은 객관의 문제다. 죽거나, 사라지거나, 지워직고 있는 자들의 몫을 쓸어 담는 자들이 자신들만의 권리 목록을 쓴 것이 ‘ 법’ 이다. 이 잔혹한 착취의 세계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가난이라는 것을 주어진 몫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뺏앗긴 권리의 목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가난의 문제만큼 객관적인 것은 없다. 즉 가난은 가장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 가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좌파’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부당하게 대접받고 현상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으로 권리를 가지는 것 같지만 실은 구조적으로 착취 받는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불러야 한다. 즉 좌우는 없어지고 위 아래는 확실한 신분사회가 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에서 조차 살 수 없어 철탑으로 굴뚝으로 공장 옥상으로 오르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뜬구름 잡는 먼 정의를 부르짓는 사람들을 ‘좌파’로 부르면서 권력과 자원을 차지하는 것을 용인하는 이 사회가 문제인 것이다.


![[성명] 이재명 정부와 현대자동차의 반노동적 기술 숙명론을 강력히 규탄한다](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thumb-66fee4f3d6f05ebcb5efd2e6e1c84809_1769997943_2133_600x358-455x300.jpg)
![[성명]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요구 행정소송 승소를 환영한다](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photo_2025-06-12_16-34-16-455x300.jpg)
![[전선] 159호 11-5 11월 총궐기, 윤석열 퇴진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행진!](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순회투쟁1-양동규-455x3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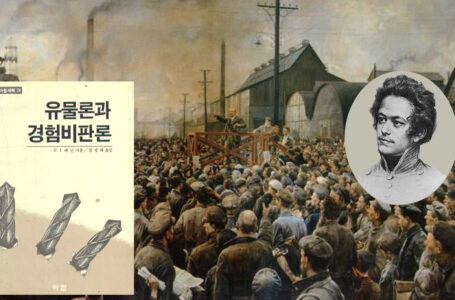

![[전선] 162호 2-3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김산-1-455x300.jpg)
4 Comments
saungsantoso.com
Fang Jifan은 손을 모으고 침묵을 지키며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binsunvipp.com
이것은 4장이고, 한 장 더 가야 합니다. Tiger는 계속합니다.
10yenharwichport.com
Hongzhi 황제는 약간 미성숙 한 표정으로 Fang Zhengqing을 바라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haring. I am worried that I lack creative ideas. It is your article that makes me full of hope. Thank you. But, I have a question, can you help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