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ㅣ 연세대 사학과 대학원생
아치 게티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스탈린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역사학자 아치 게티(Arch Getty) 선생이 그리 가셨군요. 안타깝습니다. 이 분의 연구를 반영한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분이 쓴 저작 <대숙청의 기원(Origin of the Great Purges)>은 소위 대숙청이 기존에 알려진 스탈린의 독재적 권력욕에 따른 폭력행위가 아닌 아래로 부터의 혁명적 참여에 따른 대중 투쟁적 성격을 조명했습니다. 냉전 시절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 스탈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독재자 스탈린이 편집증적 증세를 보여 세르게이 키로프를 암살하여 대숙청을 시작했고, 부하린 등의 정적들과 반대파 뿐만아니라, 자신의 심복들 마저도 의도적으로 냉혈한처럼 숙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고, 군부 숙청으로 인한 인재부족으로 1941년 독소전쟁 초기 패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게티의 연구는 과거 스탈린에 대한 연구 특히 대숙청 부분에서의 연구가 신뢰할 수 없는 출처, 허위사실을 바탕에 둔 내용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지적했고, 단순히 스탈린의 개인적 권력욕이 아닌,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 즉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분노와 공격 그리고 그속에서 전개된 대투쟁적 측면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과거 수백만 명으로 알려졌던 대숙청 사망자 숫자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실질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68만 명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공개된 문서에 기반을 둔 수치였습니다.
게티 교수의 대숙청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대숙청은 소위 트로츠키나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주장한 관료주의의 대두가 아닌, 부패한 관료들에 맞서 대중들이 적극 참여하여 그것이 지나친 숙청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일 겁니다. 즉,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이들과 스탈린의 정적들도 같이 숙청되었고, 역으로 일반적인 민간인들의 피해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대숙청이기에 적잖은 유혈을 불러왔고, 그 피해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서구 사회가 주장한 스탈린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점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아치 게티 선생은 대숙청 뿐만아니라, 굴락ㆍ홀로도모르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읽어볼만한 문헌을 남겼습니다. 비록 해당 수정주의 연구가 서구적인 맥락, 그러니까 ‘독재자 스탈린’, ‘스탈린의 범죄’라는 서구적 시각을 완벽히 벗어던진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의 여러 소련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기존의 반공주의적 서사에 큰 의문을 던지고 돌파한 점은 학술적으로 매우 큰 기여라 봅니다.
소련사 연구에 크게 기여한 대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치 게티 선생의 저작이 제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30~40년도 더 된 자료지만, 한글로 번역될 가치가 높다 봅니다. 게티 선생이 떠났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 이재명 정부와 현대자동차의 반노동적 기술 숙명론을 강력히 규탄한다](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thumb-66fee4f3d6f05ebcb5efd2e6e1c84809_1769997943_2133_600x358-455x300.jpg)
![[성명]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요구 행정소송 승소를 환영한다](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photo_2025-06-12_16-34-16-455x300.jpg)
![[전선] 159호 11-5 11월 총궐기, 윤석열 퇴진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행진!](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순회투쟁1-양동규-455x3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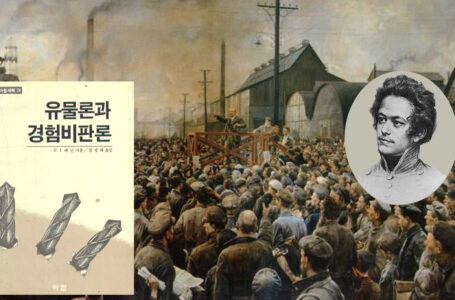

![[전선] 162호 2-3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김산-1-455x3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