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씨와 <녹색평론>에 대한 비판
문국진 ㅣ 맑스사상연구소
해마다 KDI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추거나 낮으면 큰 일이 난다고들 한다. 불황이 오고 공황이 찾아온다.
과연 자본주의경제는 ‘성장’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까? 과연 자본주의는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쓰러지고 마는 걸까? 성장은 좋은 걸까, 아니면 나쁜 걸까?
바야흐로 이 ‘성장’이라는 단어 하나에 전체 한국경제와 그 자본주의의 생존이 온통 달려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묻는다. 과연 무엇을 위한 성장이고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라고.
얼마 전에 작고한 <녹색평론>의 발행인이자 칼럼니스트인 김종철씨는 여러 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 중에서 <발언>이라는 책을 보면 사회의 제모순을 근본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대목들이 돋보이고 있다.
그런데 김씨는 그 중 “거짓 언어와 성장논리 속에서”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경제성장’ 바로 그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을 넘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구 속에 숨겨져 있는 논리적 사상은 다름아니라 ‘반성장’의 사상이다. 즉 경제성장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사회도 역시 성장을 지향한다. 즉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역사적 단계인 사회주의사희에서 생산력은 훨씬 더 고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맑스주의적 관점이다.
그런데 김종철씨는 성장 자체를 부인한다. 그는 박정희시대를 예로 들면서 그 시대의 ‘성장논리’를 비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단순한 ‘성장논리’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성장논리가 문제인 것이다.
김종철씨와 <녹색평론>이 지향하는 사회는 ‘성장논리’가 지양되고 원초적인 푸르른 공동체사회인 것같다. 마치 목가적인 공상적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이러한 환상적 관점은 가히 맑스주의적 공산주의에의 부정이며, 공산주의가 인류의 더 높은 사회단계라는 사상에의 부정이다.
한편 허먼 데일리의 <성장을 넘어서> Beyond Growth라는 책도 이와 동일한 관점을 유포하는 책이다. 이 책의 부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인데, 하긴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대체 ‘지속가능한 사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현존 사회를 ‘지속’하자는 것에 불과한 이러한 사이비 진보는 현존하는 지배적 계급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사상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적대적 계급관계의 은폐이며 따라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김종철씨와 <녹색평론>, 그리고 허먼 데일리들은 소위 ‘발전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고 만다. 즉 현존하는 자본주의세계의 발전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옳은 출발에서 시작하다가, 끝내는 발전과 성장 자체의 미래 가능성마저 거부하고 목가적인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논리에 귀착하고 만다.
물론 허먼 데일리와 김종철씨는 동일한 ‘성장논리’ 비판자이면서도 사뭇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즉 김종철씨는 거대자본주의생산력을 비판하면서 소농경제 중심의 농업사회로 돌아갈 것을 주창하고 있는 반면, 허먼 데일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해진 현존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그 체제내에서의 개량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양자는 결코 다르지 않다. 즉 그들은 ‘성장논리’ 비판이라는 근거에서 ‘사회주의적 발전논리’마저 거부하는 길을 내걸고 있는 데 다름아니다.
과거 70년대 경제성장이 한창일 때 운동권의 주요 사상은 ‘발전지상주의 비판’에 있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박정희식의 급격한 고도 자본주의적 발전에 비판적이면서도, 발전 자체를 거부하는, 역사유물론에의 무지를 반영하는 초보적인 사회비평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것의 귀결은 경제의 발전과 생산력의 무한한 성장/발전보다는 주로 ‘분배’에 초점을 두는 분배론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분배론’의 문제점은 그것이 부의 불평등을 혁신하고 재화의 재분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진보적이나, 그러나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라는 자본주의 근본모순에 눈을 감는다는 점에서, 사적 소유의 소유구조를 문제삼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체제변혁이 아니라 체제개량의 강령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는 노선이다.
김종철씨와 <녹색평론>의 노선과 강령은 그것이 소농경제의 농촌공동체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쁘띠부르주아계급의 강령이며, 역사발전의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강령이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복지’와 ‘복지국가론’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체제모순을 그대로 두고 분배구조만을 개선하자는 반변혁사상이며, 사회민주주의적 노선이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적 노선과 변혁적 사회주의의 노선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적대의 강이 흐르고 있다.
‘성장논리’라는 말로 자본주의뿐 아니라 사회주의까지도 싸잡아 거부하고 있는 김종철씨와 <녹색평론>과 허먼 데일리씨의 주장들은 요컨대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이면서 더욱이는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이자 공세에 다름아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자본주의사회의 제현상에 대해 옳게 사회비평하고 문명비평하면서도 끝내는 잘못된 길로 독자들을 유도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자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문제는 성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성장’에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적 성장 시스템, 즉 자본주의체제 시스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변혁을 희망하고 지향하는 세력에 의해 극복되고 혁파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점이 김종철씨와 <녹색평론>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차이점이다.

![[성명서]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요구 행정소송 승소를 환영한다](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photo_2025-06-12_16-34-16-455x300.jpg)

![[전선] 159호 11-5 11월 총궐기, 윤석열 퇴진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행진!](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순회투쟁1-양동규-455x3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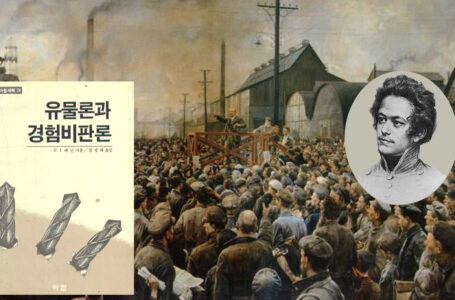

![[전선] 162호 2-3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김산-1-455x300.jpg)
3 Comments
jydoll どこで情報を入手しているのかわかりませんが、すばらしいトピックです。もっと勉強したり、もっと理解したりするのに少し時間をかける必要があります。
廉價性玩偶 https://zh-tw.sexdollsoff.com
milostná panen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