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승 용(현대사상연구소)
1.
인간은 적극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갈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이 자명한 가능성이 양날의 칼임을 실감한다. 지구에 낙원을 건설할 수도 있지만, 지구를 당장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력과 파괴력을 고려할 때,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주체적 능력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으로도 자본독재체제만은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이 망상을 노동자민중의 몸에 새겨넣지 못하면 자본독재체제는 연명할 수 없다. 자본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통해 그러한 망상을 떨쳐내는 것은 곧 노동자민중이 변혁 주체로 나서는 일이기도 하다.
현실 속의 인간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사회적 조건들의 산물이기도 하다. 인간을 규정하는 조건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과학의 주요과제다. 이러한 과학적 인식 없이는 오늘의 자본독재가 만들어낸 사회적 조건들을 바꾸고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실천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을 규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부단한 진전과정에서 우리는 자칫 인간의 활동적 주체적 측면을 망각하고 인간을 단지 역사적 사회적 조건의 산물, 즉 제반 조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객체로서만 인식함으로써 비실천적 방관적 태도나 숙명론의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 유혹이 지배자들이 애용하는 무기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유혹에 부딪칠 때면 인간 주체를 “운동의 결과이자 동시에 출발점”[1]K. 맑스: [경제학⋅철학초고], 김문현 역, 동서문화사 2014, 97쪽. 이하 ‘경철’로 약칭함. 으로 파악하고 포이어바흐까지의 비변증법적 유물론을 비판하며 ‘실천적 유물론’ 내지 변증법적 유물론의 문을 연 청년 맑스를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해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떤 것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쪽을 주체로 보고, 그러한 활동의 대상이 되는 쪽을 객체라고 보는 사고 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단순한 구분을 인정하더라도 주체와 객체의 실제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인식 차원에 한정해서 보자면, 주체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나 환경 혹은 정치경제체제나 문화물 등만 아니라 주체 자신의 욕구⋅감각⋅의식 등도 인식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식 도구로 쓰이는 개념이나 기호 혹은 감각방식 등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바로 직전까지 진행된 인식의 결과도 다시 인식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인식 도구들은 특정한 시점에서 개별 인식 주체가 자신의 것으로 써먹기 이전에 이미 제반 역사적 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규정된 상태로 존재한다. “오감의 형성은 세계사 전체의 산물”인 것이다.(경철101) 어떤 인식도 이러한 조건들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다. 또한 인식 도구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식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 정도 새로운 성격을 얻기도 한다. 그것들은 인식 주체의 의식을 본질적으로 구성하며 의식과 분리되지 않는다. 어떤 어휘나 개념을 구사하고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인식 주체 자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며, 이 모두에 앞서 별도로 존재하는 인식 주체는 없다.[2]이런 의미에서 헤겔의 다음 주장을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직접적인 자의식에서는 단순한 자아가 절대적 대상이지만, 이 절대적 대상은 우리에게 … Continue reading 이 점에서 인식 주체는 객체로서의 자신과 구분되면서도 이와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를 이룬다. 이처럼 인식 도구들이 주체 자신의 의식과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인식 도구들 자체를 대상화하여 비판하는 일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비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럴수록 각자는 지배질서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사고방식⋅감각방식 등에 사로잡혀 자신의 주체적 힘을 망각하고 자발적으로 지배질서에 복종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신의 인식 도구들에 대한 비판의식은 주체성을 기르기 위한 기본자질이다.
인식 주체 속에 자리 잡은 객관적 요소들을 고려할 때, 또 주체의 인식이 현실 전체 과정의 요소로서 이 과정에 초래하는 변화를 감안할 때,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레닌의 논의방식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레닌은 이렇게 주장한다. “유일한 불변성은, 의식과 독립해 존재하며 발전하는 외적 세계의, 인간의 의식(인간의 의식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에 의한 반영이다.”(유물론279) 그는 어떤 의식도 존재하지 않았던 먼 옛날에도 물질은 존재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의식과 독립해 있는 물질의 존재를 강조한다. 또한 의식을 지닌 주체적 존재들이 언젠가 사멸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여전히 물질은 존재할 것이다. 레닌의 근본 취지는 마하주의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주관주의를 비판하고 실제 사태를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의식을 가진 주체로서 그 물질 영역에서 시민권을 얻어 활보한다. 레닌이 의식과 독립해 존재하며 발전한다고 보는 ‘외적 세계’에는 온갖 부류의 의식적 주체들이 버글거리는 것이다. 더욱이 주체적 요인을 실제 사태에서 제거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주체적 요인을 배제하고 실제 사태 자체를 보면 그만큼 실제 사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3]유물론은 칸트가 ‘현상’ 개념으로 던져놓은 숙제, 곧 인식에 섞여 들어가는 주체적 편향들에 대한 비판적 해명작업을 피할 수 없다.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주체와 객체를 엄격히 분리하는 태도를 사물화된 의식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던 루카치는 레닌주의를 받아들인 이후 주체와 ‘독립해 있는(unabhängig)’ 객관적 사태 혹은 발전법칙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그리고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이나 상호침투 등에 대해 면밀히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도 주체와 독립해 있다는 객관적 발전법칙 속에 예컨대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형성과 조직화 등 주체적 요인들을 계산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4] G. Lukács: Tendenz oder Parteilichkeit? in: Georg Lukács Werke, Bd. 4, Neuwied/ Berlin 1971, 31쪽 참조.
2.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레닌의 논의방식은 실제 사태에 합당한 이야기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탁월한 인식을 실제 사태와 등치하여 최대의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 이데올로기투쟁 행위로서 더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레닌은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 이를 독단론이나 이데올로기의 징표로 보기 쉽지만, 그보다는 사태 파악에 대한 절대적 책임의식의 산물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은 당대 정치현실에서 책임회피를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 방식으로는 대중적 설득력을 얻거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의 타당성까지 무너뜨리는 효과를 만들었을 것이다. 2월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그의 테제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제출되어 그것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고 볼셰비키 운동에 극심한 혼선이 일어났다면, 그만큼 그의 테제는 틀린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실제 사태를 향한 레닌의 선의까지 악의로 대할 필요는 없다. 주체적 요인을 포함한 실제 사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일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적 원리로 레닌은 점근성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이는 실제 사태가 무한하며, 의식을 통한 어떤 반영도 대상과의 완벽한 일치에 도달할 수 없고, 다만 그 무한한 사태 자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이라는 실속 있는 이야기다. 현실주의자인 레닌은 칸트처럼 물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인간의 인식능력을 비하하지도 않고, 헤겔처럼 주체와 객체가 동일해지는 절대지의 단계에 도달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도 않는다. 그는 경험적 인식 주체가 얻어낸 근사치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폄하하지 않고 그에 알맞게 존중하면서, 무궁무진한 현실에 무한히 접근해가는 인식의 과정적 성격을 강조할 뿐이다.(유물론66,163,279,345) 이때 접근이라는 말은 자칫 대상을 고정시켜 놓고 다가간다는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자체도 시간 속에서 운동하고 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접근과정을 통해 인식 주체의 의식도 변하며, 주체의 변화와 더불어 주체를 포함하는 객체도 다시 변한다. 아울러 인식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단인 실천도 변해갈 수밖에 없으며, 검증의 수단인 실천도 다시 검증에서 면제될 수 없다. 이 전면적 변화의 복합체 앞에서 기죽지 않고 실제 사태의 변화를 따라잡으며 좀 더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인식해감으로써 효과적 개입의 가능성을 넓히고, 또 그러한 인식성과에 근거해 기민하게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 변혁적 인식 주체의 역할이다. 이로써 실제 사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쉽게 포기하는 주의주의의 폐해만 아니라, 과학의 이름으로 주체를 객체의 위치에 주저앉히는 숙명론적 냉소주의의 독소에 대해서도 면역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3.
지젝은 ‘사회현실에 묻혀 있는(embedded) 과정으로서의 사유’를 강조함으로써 포스트모던 시대의 주체 부활에 기여한다. 또 그는 필연적 인과의 그물이라는 관념을 전근대적 신학적 세계관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현실 그 자체의 존재론적 불완전함’을 내세움으로써, 추상적 숙명론을 타파하고 주체의 활동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무엇보다 그는 룩셈부르크의 이론을 근거로 혁명주체 형성의 변증법적 경로에 대해 논한다. 그에 따르면 노동자계급이 권력장악에 필요한 자질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급하게’ 권력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순간은 절대 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당한 시기’는 혁명적 주체의 성숙을 전제하는데, 이는 혁명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한 시기’는 실패로 귀착된 일련의 ‘성급한’ 시도들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5]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인간사랑 2003, 110-111쪽 참조. 이러한 논리의 효능은 룩셈부르크의 이론만 아니라 레닌과 게바라 등의 실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혁명적 조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았던가.
그러나 ‘현실 그 자체의 존재론적 불완전함’을 상정하는 지젝의 혁명주체 이론은 필연적 연관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소홀히 하고 주체의 의지에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결단론 내지 주의주의로 기운다. 혁명적 실천의 복잡다단한 변수들, 특히 자본독재체제로 인해 당연시되는 주체들의 고정관념들, 욕구들, 무의식적 변수들만 아니라, 주체들의 폭발적 잠재력, 구체적 가능성, 운동이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효과들 등을 모두 감안하여 전략전술을 짜는 일은 생산양식이나 사회구성체에 기초한 포괄적 정세분석을 넘어서는 과제다. 이 모든 변수들을 완벽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들의 현실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총체적⋅전략적으로 접근할수록 그만큼 실천은 효과적일 것이다. 이 경우 현실의 제반 요인들이 ‘존재론적 불완전’ 상태로 있지 않고, 필연적 인과관계를 지닌다고 상정한다고 해서 추상적 결정론에 빠지거나 주체의 자유공간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6]필연과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기로 한다. 엥겔스도 추상적 결정론을 비판하지만 지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는 프랑스 유물론이 내세우는 추상적 필연성으로는 신학적 자연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공허한 말장난’에 그치는 그러한 필연성이 아니라 원인들의 고리를 추적하는 구체적 과학적 인식을 요구한다.[7]F. 엥갤스: [자연의 변증법], 한승완 외 역, 새길 2012, 222쪽 참조.
이러한 인식의 확대가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 주체를 다시 사회적 역사적 조건의 산물, 즉 ‘운동의 결과’로서만 대하면서 결정론적 냉소주의를 퍼뜨리는 사태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변혁 주체들이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임을 실천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자본독재체제를 넘어서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해방적 실천 없이 노동자민중이 주체로 일어서고 존중받을 방법도 없다. 해방적 실천 속에서만 과학의 성과들은 노동자민중을 착취와 통제의 대상으로, 노예로, 개돼지로 만드는 자본권력의 수단에서 노동자민중의 해방 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
(2023. 4. 24.)
주
| ↑1 | K. 맑스: [경제학⋅철학초고], 김문현 역, 동서문화사 2014, 97쪽. 이하 ‘경철’로 약칭함. |
|---|---|
| ↑2 | 이런 의미에서 헤겔의 다음 주장을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직접적인 자의식에서는 단순한 자아가 절대적 대상이지만, 이 절대적 대상은 우리에게 혹은 즉자로서 절대적 매개”이다.(현상학150) 여기서 ‘우리’는 사정을 꿰뚫어 보는 철학자, ‘즉자로서’는 실제로, ‘매개’는 제반 조건들의 산물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도르노는 선험적 주체를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이해한다.(부정257) 이 경우 ‘사회’는 ‘사회적 주체’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 ↑3 | 유물론은 칸트가 ‘현상’ 개념으로 던져놓은 숙제, 곧 인식에 섞여 들어가는 주체적 편향들에 대한 비판적 해명작업을 피할 수 없다. |
| ↑4 | G. Lukács: Tendenz oder Parteilichkeit? in: Georg Lukács Werke, Bd. 4, Neuwied/ Berlin 1971, 31쪽 참조. |
| ↑5 |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인간사랑 2003, 110-111쪽 참조. |
| ↑6 | 필연과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기로 한다. |
| ↑7 | F. 엥갤스: [자연의 변증법], 한승완 외 역, 새길 2012, 222쪽 참조. |



![[전선] 159호 11-5 11월 총궐기, 윤석열 퇴진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행진!](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순회투쟁1-양동규-455x300.jpg)

![[전선] 162호 2-3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김산-1-455x3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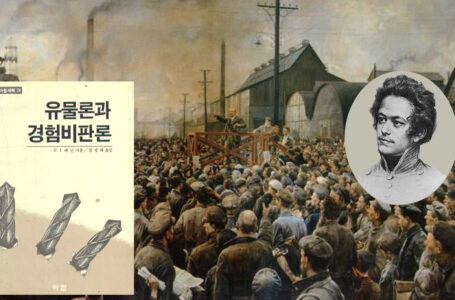
184 Comments
Thank you for your sharing. I am worried that I lack creative ideas. It is your article that makes me full of hope. Thank you. But, I have a question, can you help me? https://accounts.binance.com/en-IN/register-person?ref=UM6SMJM3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сервисный центр по ремонту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с выездом на дом.
Мы предлагаем: ремонт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в мск
Наши мастера оперативно устранят неисправности вашего устройства в сервисе или с выездом на дом!
Your point of view caught my eye and was very interesting. Thanks. I have a question for you.
swot анализ вопросы swot анализ среды
русское домашнее порно порно с русской озвучкой
купить шпонированную дсп шпонированный мдф купить
геотекстиль typar цена геотекстиль для пруда цена
Включение в реестр Минпромторга https://minprom-info.ru официальный путь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дготовка и подача документов, юридическ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и консультации для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латформа онлайн-обучения https://craftsmm.ru курсы по маркетингу, продажам и рекламе для новичко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Освойте современ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продвижения, увеличьте продажи и развивайте карьеру в удобном формате.
Написание дипломов на заказ https://vasdiplom.ru помощь студентам в подготовке итоговых работ. Авторские тексты, проверка на уникальность и полное соответствие стандартам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смотря порно онлайн купить трубку для мефа
Обучение и семинары https://uofs-beslan.ru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практические кейсы и опыт экспертов. Развивайте навыки, повышайте квалификацию и получайте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Школа видеорекламы https://tatyanamostseeva.ru обучение созданию креативных роликов для бизнеса и брендов.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работа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и поддержка экспертов. Освойте профессию в сфере digital.
Авто портал https://diesel.kyiv.ua все о мире автомобилей: новости, обзоры моделей, тест-драйвы, советы по выбору и уходу за авто. Каталог машин, актуальные цены, автоуслуги и полез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автовладельцев.
Все для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https://k-moto.com.ua на авто портале: новости, обзоры, статьи, каталоги и цены на автомобили. Экспертные мнения, тест-драйвы и практические советы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авто.
Авто портал https://avtoshans.in.ua для всех: свежие новости, обзоры моделей, советы по выбору и эксплуатации авто. Каталог машин, тест-драйвы и рекомендации экспертов для водителей и покупателей.
Автомобильные новости https://reuth911.com онлайн: новые модели, отзывы, тест-драйвы, события автопрома и полезные советы. Узнайте первыми о главных новинках и трендах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ира.
Портал про автомобили https://myauto.kyiv.ua онлайн-ресурс для автолюбителей. Обзоры, статьи, тест-драйвы, цены и полезные советы по ремонту и уходу за машиной. Всё о мире авто в одном месте.
Свежие новости авто https://orion-auto.com.ua тест-драйвы, обзоры новинок,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и аналитика авторынка.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автомобилях и автоиндустрии для водителей и экспертов.
Автомобильный сайтhttps://setbook.com.ua свежие новости, обзоры моделей, тест-драйвы и советы экспертов. Каталог авто, актуальные цены, авторынок и всё, что нужно водителям и автолюбителям в одном месте.
Онлайн-сайт для женщин https://musicbit.com.ua стиль, уход за собой, психология, семья, карьера и хобби. Интересные статьи, тесты и форум для общения.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вдохнов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Онлайн-журнал для женщин https://fines.com.ua стиль, уход за собой, психология, рецепты, материнство и карьера. Актуа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тренды и экспертные рекомендации каждый день.
Женский сайт о жизни https://prettywoman.kyiv.ua секреты красоты, мода, здоровье, рецепты и отношения. Интересные статьи, советы и лайфхаки. Всё, что нужно, чтобы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уверенно и счастливо.
Онлайн-сайт про автомобили https://tvregion.com.ua свежие новости, аналитика рынка, обзоры и сравнения машин. Советы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и выбору авто. Всё для водителей и автолюбителей в одном месте.
Автомобильный портал https://troeshka.com.ua онлайн-ресурс для автовладельцев. Каталог машин, тест-драйвы, аналитика авторынка и сове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Будьте в курсе новинок и технологий автоиндустрии.
Сайт для женщин https://lolitaquieretemucho.com мода, красота, здоровье, отношения, семья и карьера. Полезные советы, статьи, рецепты и лайфхаки.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вдохнов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созданное для сов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Сайт для женщин https://femaleguide.kyiv.ua гармония стиля и жизни. Уход за собой, рецепты, дом, отношения, карьера и путешествия. Читайте статьи, делитесь опытом и вдохновляйтесь новыми идеями.
Сайт про машины https://tvk-avto.com.ua обзоры моделей, тест-драйвы, новости автопрома и советы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Полезные статьи о выборе авто, уходе, ремонте и актуа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для автовладельцев.
Женский онлайн портал https://femalesecret.kyiv.ua онлайн-ресурс для девушек и женщин. Мода, красота, здоровье, семья и материнство. Полезные советы, эксперт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позитивное сообщество для общения и вдохновения.
Женский сайт https://lubimoy.com.ua стиль, уход за собой, психология, материнство, работа и хобби. Актуальные статьи, тренды и экспертные советы. Всё самое важное для гармоничной жизни и успеха.
Сайт для женщин https://amideya.com.ua портал о красоте, стиле, здоровье, семье и саморазвитии. Ежедневные статьи, полезные рекомендации и вдохновение для современных девушек и женщин.
Семейный портал https://geog.org.ua всё для гармонии в доме: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отношения, здоровье, отдых и уют. Полезные советы, статьи и лайфхаки для всей семьи. Пространство, где находят ответы и вдохновение.
Женский сайт https://family-site.com.ua современный портал о моде, красоте, отношениях и саморазвитии. Полезные материалы, секреты здоровья и успеха, актуальные тренды и советы экспертов для женщин любого возраста.
Портал о здоровье https://mikstur.com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ресурс о медицине и ЗОЖ. Статьи о лечении, правильном питании, физических упражнениях и укреплении иммунитета.
Современный женский https://happywoman.kyiv.ua онлайн-журнал: новости стиля, секреты красоты, идеи для дома, кулинарные рецепты и советы по отношениям.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вдохнов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Портал про детей https://mch.com.ua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ресурс для родителей. От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ухода за малышом до воспитания школьников. Советы, статьи и поддержка для гармонич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бёнка.
Женский онлайн-журнал https://girl.kyiv.ua стиль, уход за собой, психология, кулинария, отношения и материнство. Ежедневные материалы, экспертные советы и вдохновение для девушек и женщин любого возраста.
Онлайн-журнал для женщин https://krasotka-fl.com.ua всё о красоте, моде, семье и жизни. Полезные статьи, лайфхаки, советы экспертов и интересные истории. Читайте и вдохновляйтесь каждый день.
Your article helped me a lot, is there any more related content? Thanks! Binance US Pagpaparehistro
Онлайн-журнал https://presslook.com.ua для женщин объединяет всё, что важно: мода и стиль,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карьерные советы и вдохновение. Сове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реальные истории для поддержки и новых идей.
Актуальные тренды https://horoscope-web.com и вневременная классика. Подборки образов, советы по стилю, секреты гардероба и модные инсайты. Мы поможем тебе выглядеть безупречно каждый день и выразить свой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стиль.
Твой гид https://nicegirl.kyiv.ua по здоров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Эффективные тренировк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питание, wellness-практики и советы по мотивации. Обрети энергию, силу и гармонию в теле, которое ты любишь.
Ресурс для амбициозных https://ramledlightings.com и целеустремленных. Карьерный рост, лична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финансовая грамотность и вдохновляющие истории успеха. Реализуй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и добивайся всех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курсовой проект купить цена где заказать курсовую
займ онлайн кредитная карта онлайн займ
быстрый займ онлайн взять займ онлайн
Журнал для женщин https://rpl.net.ua которые строят карьеру и хотят большего. Финансовая грамотность, советы по продуктивности, истории успеха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ереговорам. Достигайте своих целей с нами!
Твой гид https://womanlife.kyiv.ua по стильной жизни. Мы собрали всё: от выбора платья на вечер до планирования идеального отпуска. Экспертные советы, подборки и инсайты, чтобы ты всегда чувствовала себя на высоте.
Онлайн-журнал о моде https://glamour.kyiv.ua без правил. Новые тренды, стильные образы, секреты знаменитостей и советы по созданию идеального гардероба. Мы поможем вам найти и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выразить свой уникальный стиль.
Женский сайт https://bbb.dp.ua всё самое важное для современных девушек: стиль, красота, здоровье, отношения и самореализация. Читайте, вдохновляйтесь и находите новые идеи.
Новостной портал Украины https://lenta.kyiv.ua оперативные события в стране.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региональные новости, спорт и культура. Достовер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аналитика каждый день.
Новостной сайт https://vesti.in.ua свежие события дня: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культура, спорт, технологии и общество. Акту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аналитика и репортаж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и мира.
Свежие новости https://sensus.org.ua Украины и мира: главные события, репортажи и аналитика.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общество и культура в удобном формате онлайн.
Свежие новости Украины https://novosti24.kyiv.ua главные события, мнения экспертов и аналит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Лента новостей онлайн, репортажи и достоверные факты без перерыва.
Новости Украины https://status.net.ua объектив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бытиях страны.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региональные новости, спорт и культура. Читайте актуа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каждый день.
Новостной портал https://mediateam.com.ua всё самое важное сегодня: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культура, спорт и шоу-бизнес. Лента новостей, репортажи и аналит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каждый день.
Новости Украины и мира https://mostmedia.com.ua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культура, спорт и общество. Свежие события, аналитика и репортажи. Будьте в курсе главных новостей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24/7.
частный вывод из запоя вызов нарколога на дом Томск
Онлайн новостной портал https://reporternews.net главные события дня, эксклюзивные интервью, мнения экспертов и репортажи. Достовер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политике, бизнесе и жизни общества.
Новостной портал https://newsawait.com свежие новости, аналитика и обзоры.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культура и спорт. Лента событий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с проверенными фактами.
Портал про авто https://dream-autos.com новости, обзоры и тест-драйвы. Полезные советы по выбору, ремонту и эксплуатации автомобилей. Каталог машин, актуальные цены и аналитика авторынка.
Новости Украины и мира https://globalnewshome.com всё самое важное сегодня.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региональные события, спорт и культура. Объективные статьи и аналитика в удобном формате.
Портал для женщин https://womanfashionista.com всё самое важное в одном месте: уход за собой, мода, дом, семья и карьера. Читайте полезные статьи, находите вдохновение и делитесь опытом.
Сайт детского сада https://malush16.ru МКДОУ 16 «Малыш» Омутнинского района — документы,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стандарты, новости, фотогалерея и полезные материалы для родителей и педагогов.
Статьи для садоводов https://portalteplic.ru огородников, фермеров и пчеловодов: советы по уходу за растениями, животными и пасекой. Полезные инструкции, лайфхаки и сезонные рекомендации.
Сайт про металлопрокат https://the-master.ru каталог продукци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и сферы применения. Арматура, балки, трубы, листы и профили. Актуальные цены, сове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полезные статьи.
Всё про ремонт https://gbu-so-svo.ru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 статьи, инструкции и советы для мастеров и новичков. Обзоры материалов, проекты домов, дизайн интерьеров и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троительный портал https://krovlyaikrysha.ru база знаний и идей. Статьи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ремонте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инструкции, подбор материалов и сове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Автомобильный портал https://ivanmotors.ru всё о машинах в одном месте. Тест-драйвы, обзоры, аналитика авторынка и сове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Актуальные события мира авто для водителей и экспертов.
Сайт для женщин https://devchenky.ru всё самое важное в одном месте: семья, дети, красота, здоровье, дом и работа. Сове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лайфхаки и вдохновение на каждый день.
Сайт о ремонте https://e-proficom.ru полезные статьи, пошаговые инструкции и советы экспертов. От выбора материалов до дизайна интерьеров. Всё, что нужно для ремонта квартир и домов.
Блог о ремонте https://ivinstrument.ru полезные статьи, пошаговые инструкции и советы экспертов. Всё о ремонте квартир и домов: выбор материалов, дизайн интерьеров и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Городской портал Москвы https://moscowfy.ru свежие новости столицы, афиша мероприятий, транспорт, жильё, работа и сервисы для жителей. Полез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москвич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на одном сайте.
перевод документа на русский телефон бюро переводов
Подборка статей https://yandex-direct-info.ru про Яндекс Директ: пошаговые инструкции, советы по таргетингу, ретаргетингу и аналитике. Всё о рекламе в Яндексе в одном месте для вашего бизнеса.
Яндекс Бизнес https://business-yandex3.ru описание сервиса, его инструменты и функции. Как компаниям привлекать клиентов, управлять рекламой и повыша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нлайн-продвижения.
Что такое Agile https://agile-metod.ru и как его внедрить? Подробные статьи о гибких методологиях, инструментах и практиках. Scrum, Kanban и Lean — всё о совреме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проектами.
Что такое CPI https://cost-per-install.ru в маркетинге? Полное объяснение показателя Cost Per Install: как он работает, зачем нужен бизнесу, примеры расчётов и советы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метрики в рекламе приложений.
cocaine prague telegram https://cocaine-prague-shop.com
buy xtc prague high quality cocaine in prague
Графитовые и угольные щетки для электроинструмента. Большой выбор, надёжность и долговечность. Подходят для дрелей, болгарок, перфораторов и друг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Нужны двери? межкомнатные двери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я в спб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межкомнатных дверей от Вектордорс. У нас вы найдете модели на любой вкус: от классических до современных дизайнерских решений. Выбор межкомнатных дверей — важный этап обустройства помещения. Правильно подобранные двери не только украсят интерьер, но и обеспечат комфорт и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ь на долгие годы.
гравий речной цена продажа ПГС оптом
Интернет-маркетинг https://internet-marketing1.ru SEO, контекстная реклама, SMM, email-рассылки и аналитика. Статьи, советы и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привлекать клиентов и увеличивать продажи онлайн.
Интернет-маркетинг https://yandex-reklama2.ru для компаний и специалистов: SEO, SMM, контекстная реклама и email. Советы по выбору стратегий, разбор ошибок и методы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Клининговая компания https://cleaningplus.ru в Москв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уборка квартир, домов и офисов. Генеральная, ежедневная, послестроительная уборка, химчистка мебели и ковров. Доступные цены и гарантия качества.
На сайте «Детский Класс» https://www.detskiyklass.ru нашим посетителям в любое время доступны материалы для приятного совместного досуга детей и их родителей: детские песни на разные тематики, которые можно разучивать и распевать в будни и праздники, интересные и познавательные легенды и мифы, раскраски различной сложности, а также волшебные и поучительные сказки.
columbian cocain in prague buy mdma prague
buy mdma prague buy cocaine in telegram
cocaine prague buy mdma prague
быстрый займ микрозайм взять
Нужна лабораторная? лабораторная работа заказ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одход, проверенные решения, оформление по требованиям. Доступные цены и быстрая помощь.
Нужна презентация? сколько стоит заказать презентацию Красочный дизайн,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ый материал, уникальное оформление и быстрые сроки выполнения.
Нужен чертеж? где заказать чертеж выполним чертеж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на заказ.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одход, грамотное оформление, соответствие требованиям преподавателя и высокая точность.
prague plug cocain in prague from columbia
buy cocaine in telegram buy coke in prague
buy cocaine prague buy mdma prague
Проблемы с откачкой? https://otkachka-vody.ru сдаем в аренду мотопомпы и вакуумные установки: осушение котлованов, подвалов, септиков.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до 2000 л/мин, шланги O50–100. Быстрый выезд по городу и области, помощь в подборе. Суточные тарифы, скидки на долгий срок.
Нужна презентация? сделать презентацию через нейросеть Создавайте убедительные презентации за минуты. Умный генератор формирует структуру, дизайн и иллюстрации из вашего текста. Библиотека шаблонов, фирстиль, графики, экспорт PPTX/PDF,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и комментарии — всё в одном сервисе.
демонтаж бетонної стяжки https://remontuem.te.ua
значки на заказ заказать значки со своим дизайном
печать значков москва изготовление значков на заказ москва
печать на значках москва производство значков на заказ
joszaki regisztracio joszaki.hu/
joszaki regisztracio joszaki.hu
joszaki regisztracio joszaki.hu/
Металлообработка и металлы j-metall ваш полный справочник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материалам: обзоры станков и инструментов, таблицы марок и ГОСТов, кейсы производства, калькуляторы, вакансии, и свежие новости и аналитика отрасли для инженеров и закупщиков.
melbet telecharger paris sportif foot
africain foot 1xbet cameroun apk
адрес фитнес клуба фитнес клуб цены
Сливы курсов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ЕГЭ бесплатно https://courses-ege.ru
afrik foot pronostic info foot africain
Портал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омов https://doma-land.ru проекты и сметы, сравн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каркас, газобетон, кирпич, брус), фундамент и кровля, инженерия и утепление. Калькуляторы, чек-листы, тендер подрядчиков, рейтинги бригад, карта цен по регионам, готовые ведомости материалов и практика без ошибок.
Квартира с отделкой https://новостройкивспб.рф экономия времени и предсказуемый бюджет. Фильтруем по планировкам, материалам, классу дома и акустике. Проверяем стандарт отделки, толщину стяжки, ровность стен, работу дверей/окон, скрыт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Приёмка по дефект-листу, штрафы за просрочку.
Компания «СибЗТА» https://sibzta.su производит задвижки, клапаны и другую трубопроводную арматуру с 2014 года. Материалы: сталь, чугун, нержавейка. Прочные уплотнения, стандарты ГОС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решения под заказ, быстрая доставка и гарантия.
займ на карту срочно получить займ онлайн за 5 минут
финансовый займ микрозайм за 10 минут онлайн
займы организации https://zaimy-59.ru
займ срочно без проверок займ без лишних документов
мгновенный онлайн займы https://zaimy-61.ru
заем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https://zaimy-69.ru
денежный займ https://zaimy-67.ru
взять займ онлайн все займы рф
кредитная карта займ займ без процентов новым клиентам
займ с плохой кредитной список займов онлайн
получить займ https://zaimy-82.ru
займ на карту без отказа займ без проверок и поручителей
взять займ онлайн https://zaimy-88.ru
кредитная карта займ https://zaimy-90.ru
Скачать видео с YouTube https://www.fsaved.com онлайн: MP4/WEBM/3GP, качество 144p–4K, конвертация в MP3/M4A, поддержка Shorts и плейлистов, субтитры и обложк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быстро и безопасно, на телефоне и ПК. Используйте только с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 в рамках правил YouTube.
Часто на https://siviagmen.com перевіряю нові оголошення.
По картинке https://buybuyviamen.com сделали антресоль над дверью.
На сайті mr-master.com.ua побачила круті ідеї для тайників у домі.
На сторінці zebraschool.com.ua відремонтували дитячу коляску у Чернівцях — все без проблем
ЛідерUA – інформативний портал https://liderua.com новин та корисних порад: актуальні події України, аналітика, життєві лайфхаки та експертні рекомендації. Все — щоб бути в курсі й отримувати практичні рішення для щоденного життя та розвитку.
Выбрали лучшее смотрите: https://journal-ua.com/tekhnolohii/podklyuchenie-i-sovmestimost-naushniki-dlya-telefona-noutbuka-i-tv.html
Авторский MINI TATTOO https://kurs-mini-tattoo.ru дизайн маленьких тату, баланс и масштаб, безопасная стерилизация, грамотная анестезия, техника fine line и dotwork. Практика, разбор типовых косяков, правила ухода, фото/видео-съёмка работ. Материалы включены, сертификат и поддержка сообщества.
сколько стоит changan https://changan-v-spb.ru
Курсы по наращиванию https://schoollegoart.ru ресниц, архитектуре и ламинированию бровей/ресниц с нуля: теория + практика на моделях, стерильность, карта бровей, классика/2D–4D, составы и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я. Материалы включены, мини-группы, сертификат, чек-листы и помощь с портфолио и стартом продаж.
PRP-курс для косметологов плазмотерапия обучение доказательная база, отбор пациентов, подготовка образца, техники введения (лицо, шея, кожа головы), сочетание с мезо/микронидлингом. Практика,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фото/видео-фиксации, юридические формы, маркетинг услуги. Сертификат и кураторство.
Лучшее без воды здесь: https://version.com.ua/transport.html
Сайты про новости кино https://fankino.ru
Фото из армии Prosoldat фот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съёмка армии: присяга, парады, учения. Создаём армейские альбомы, фотокниги, постеры; ретушь и цветокор, макеты, печать и доставка. Съёмочные групп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аккредитация и дисциплина, чёткие сроки и цены.
Мучает зуд и жжение? Геморой – лечение без боли и очередей: диагностика, консервативная терапия, латексное лигирование, склеротерапия, лазер. Приём проктолога, анонимно, в день обраще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лан, быстр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онятные цены и поддержка 24/7.
Лучшее без воды здесь: https://salonbeauty24.info/lazernaya-epilyatsiya-bikini-printsip-raboty-i-effektivnost-metoda
The latest as of this hour: https://israelkonferenz.de/kupit-akkaunt-tiktok-tik-tok/
Хочешь вылечить геморрой – современный подход к лечению геморроя: точ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ерсональный план, амбулаторные процедуры за 20–30 минут. Контроль боли, быстрый возврат к активной жизни,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образу жизни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анонимность и понятные цены.
Нужна ликвидация? закрыть доо: добровольная ликвидация, банкротство, реорганизация. Подготовка документов, публикации, сверка с ФНС/ПФР, закрытие счетов. Сроки по договору, прозрачная смета,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ь, сопровождение до внесения записи в ЕГРЮЛ.
Если вы планируете собрать мощный игровой ПК, стоит учитывать не только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но и надежность комплектующих. На страницах блога представлены обзоры готовых решений, а также советы п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сборке систем, которые подойдут как для повседне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так и для требовательных современных игр.
Всё для дачи и цветов https://amandine.ru/ журнал с понятными инструкциями, схемами и списками покупок. Посев, пикировка, прививка, обрезка, подкормки, защита без лишней химии. Планировки теплиц, уход за газоном и цветниками, идеи декора, советы экспертов.
Портал про все https://version.com.ua новини, технології, здоров’я, будинок, авто, подорожі, фінанси та кар’єра. Щоденні статті, огляди, лайфхаки та інструкції. Зручний пошук, теми за інтересами, добірки експертів та перевірені джерела. Читайте, навчайтеся, заощаджуйте час.
Журнал для дачников https://www.amandine.ru и цветоводов: что посадить, когда поливать и чем подкармливать. Календарь, таблицы совместимости, защита от вредителей, обрезка и размножение. Планы грядок, тепличные секреты, бюджетные решения и советы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Купить квартиру https://novostroydoma.ru в городе выгодно: топ-жилые комплексы, удобные планировки, паркинг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рядом. Ипотека, семейная ипотека 6%, маткапитал. Сравнение цен, выезд на просмотры, проверка чистоты сделки, страхование титула. Экономим время и деньги.
Квартира вашей мечты https://kvartiracenter-kypit.ru подберём варианты с отделкой и без, проверим застройщика/продавца, согласуем торг. Ипотека 6–12%, семейные программы, маткапитал. Онлайн-показы, электронная подача в Росреестр, безопасная оплата. Экономим время и бюджет.
перейдите на этот сайт https://kra48at.at
узнать больше https://kra46att.at
содержание https://kra47at.at/
этот контент https://kra46att.at
Подробнее https://kra46att.at/
Узнать больше https://kra47at.at/
Build a metabolism that supports your life – not one that leaves you hungry, tired, and frustrated. https://metabolicfreedom.top/ metabolic freedom book
visit our website https://jaxxwallet-web.org/
More about the author https://jaxxwallet-web.org/
visit their website https://jaxxwallet-web.org
site here https://prjx.online/
hop over to here https://dexrp.buzz
more information https://plasma.credit
в этом разделе https://kra46att.at/
my website https://kinetiq.lat/
look what i found https://hypperswap.space
anonymous https://gluex.io/
learn the facts here now https://liquity.cfd
go https://plasma.credit
Click This Link https://defi-money.cc
why not try these out https://g8keep.org/
Source https://looksrare.cfd
see https://dexrp.wtf/
try here https://berapaw.org
find out https://hlp0.cloud
index https://looksrare.cfd
discover this info here https://avalonfinance.cc
check my blog https://jaxxwallet-web.org/
New Member Introduction – Happy to Join the Community
New Member Introduction – Happy to Join th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