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엽 ㅣ 경기영상과학고 교사
요즘 고등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점제’ 준비한다고 부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혹자들은 2025년부터 우리 교육이 그동안의 정책과 매우 다른 결의 제도가 뿌리내린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통상 교육정책을 전체 학교 현장에 적용 전에 일부 학교에 시범운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지난 2월 25일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밝혔듯이 경기도 85.3%인 319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한다. 과거 수구적 정부에서 교육정책도 이렇게 속도를 내지 않았다. 연구시범운영 대상 학교가 이 정도면 경기도의 경우 25년 시행이 아니라 21년 시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25년 적용을 예고한 일반계 고교보다 직업계고는 22년부터 차례대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직업계고교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빠르게 직업계고가 정부의 정책에 실험대상이 되었을까? 두 가지 지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조적 문제이다. 같은 학년의 학생은 같은 나이로 구성되어있다. 시기가 되면 졸업하는 학년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학년제와 학기단위제가 병존하는 체제이다. 특히, 직업계고는 대학 학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토대가 다르지만 중등후기의 공교육으로 편입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양성과 자율성을 일반계고보다 높게 누렸다. 다른 하나는 학교 내부의 문제이다. 수업 사태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이 온전하게 학생의 발달과정에 남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이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잘되고 있지 않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다.
직업계고의 유사 학점제 운영 역사는 길게는 30년 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목적으로 당시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체제를 개악하였다. 주요 골격은 학교명과 학과명을 변경이었으며, 취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심어 놓는다.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대학에 ‘토목’을 전공했다. 건축과 토목이 통합되는 ‘건설’교과로 발령을 받았다. 건축과 토목의 공통분모는 상당해서 건축과에 재직할 때 교육활동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올해 발령받은 경기영상과학고 영상무대디자인과보다는 수월했다. 올해 내가 담당해야 할 노동조건이다. 건축과를 기반한 학과 1학년 담임, 1학년 색채디자인, 2학년 영상제작기초와 컴퓨터그래픽이다. 학교에서는 부전공 연수와 직무연수를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문제는 한 학교의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나의 비전문적 교육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해답은 비정규직 확대정책이다.
이재정 교육감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이래서, 세상이 저래서라고만 할 것인가?”라고 고교학점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였다. 세상이 변하면 교육 활동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나의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교육철학과 방식으로 교육받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된다고, 졸업후 성공시대를 열겠다면서 30년 동안 강력하게 추진한 유사 학점제의 모습이 위와 같았다. 직업계고 모습처럼 일반계고는 대입으로 왜곡될 것이다. 교사인 나의 교육활동에 알량한 만족을 위해서 학생의 미래를 답보해서 실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학점제처럼 이색적인 교과 신설과 백화점 같은 교육과정 편성은 지식의 이해 수준이 단편적이고 표면적으로 남게 된다. 우리 교육은 인간화교육, 가치교육과 같이 우리 삶에 활용되거나 의미가 있는 교육적 지식이 체계화된 교과교육으로 기대에 한다. 시대 변화에 교육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는 교육내용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선] 159호 11-5 11월 총궐기, 윤석열 퇴진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행진!](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순회투쟁1-양동규-455x3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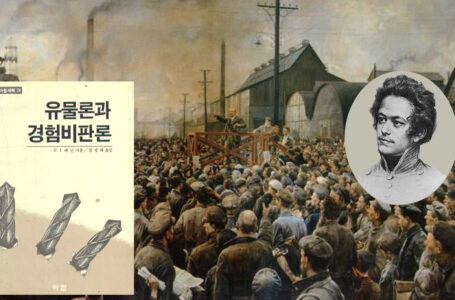
![[전선] 162호 2-3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김산-1-455x300.jpg)
One Comment
Thank you for your sharing. I am worried that I lack creative ideas. It is your article that makes me full of hope. Thank you. But, I have a question, can you help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