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노동자신문 1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박찬웅 ㅣ 노동자신문 편집위원
영화 ‘서울의 봄’ 열기가 뜨겁다. 12. 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 12일째(12.3 기준) 관객 425만 명을 넘어섰다. 영화는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쿠데타 주도세력인 하나회와 우유부단하며 보신주의에 가득 찬 군부의 상층관료들, 그리고 쿠데타를 저지하려는 소수 장교 간의 대비를 통해서 긴장감 있게 표현했다. 영화는 과도한 설정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애국주의적 서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간의 대비만으로도 상영시간 2시간 21분 15초 내내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쿠데타 저지 측에 서 있던 8공수 여단이 쿠데타군 수뇌부들이 모여 있던 수도사령부 경비단을 타격하기 위해 서울로 진입하려는 순간 관객들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관객들의 기대와는 달리 육군본부 벙커에 모여 있던 군부 상층관료들은 다 같은 국군 아니냐는 타협과 절충을 앞세운 채 쿠데타군과 신사협정을 맺고 8공수를 회군시켰다.
그 사이 전방에 있던 노태건의 3사단과 2공수여단이 서울로 진입할 수 있었다. 전두광의 합수부에 의해서 언론과 모든 정보가 차단되고 통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그 늦은 밤, 거리의 사람들은 서울로 진입하는 한강 다리가 통제되면서 영문도 모른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에서 쿠데타군의 진입을 늦추는 바리케이트 역할밖에는 할 수 없었다. 대세가 기울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채 숨어 있던 국방부 장관, 군부 상층관료들은 쿠데타의 사후적 승인을 위한 병풍이 되었다. 영화 내내 보여 준 그들의 기회주의적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적 행태는 관객들의 분통을 터지게 했고, 혹시나 관객들이 기대했을 알려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영화적 배반에 대한 기대감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다음 날 새벽, 전두광과 하나회 장성들은 참모총장 정상호 체포 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결재 서류를 내밀었다. 사태의 진정한 정치적 의미도 모른 채, 긴박했던 밤을 보냈던 대통령은 자신이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민주주의자임을 보여 주는 소극적 저항에 멈추어 섰다. 결재 서류에 ‘12·13 05:10 AM’이라는 승인 일자와 시각이 클로즈업되며, 12·12 사태의 계기가 되었던 참모총장의 체포가 사후적 승인임을 보여 주었다. 쿠데타 저지 군의 희생과 노력이 좌절로 끝나고 자기 체면이나 세우려는 소심한 저항을 보는 관객이 느끼는 기분은 쿼바디스(우리를 놔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였을 것이다.
‘서울의 봄’은 영화가 가지는 편집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동 시간대의 쿠데타군과 반란 저지군의 공간을 짧게 교차시켜 보여 줌으로써, 쿠데타군과 저지군 간에 대치 과정의 긴박감을 높여주었다. 12.12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루어진 짧은 시간대와 쿠데타군과 저지군이라는 대립 구도가 명확한 사건에 걸맞은 빠른 교차편집은 관객들에게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속도감을 느끼게 했다. 영화의 편집은 시대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핵심적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보여 주는 쇼츠(15초 이내의 짧은 영상) 영상의 연속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영화 관람객들의 반응도 다른 영화들과는 달라 보였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쿠데타에 성공한 하나회 장교들이 보안사령부 앞에 모여서 촬영한 쿠데타 성공 기념사진을 보여 주었고, 쿠데타 이후 개개인의 출세 이력이 그 사진 위에 자막으로 겹쳐 흘렀다. 전두광과 노태건은 대통령이 되었고 나머지들도 장관이며 국회의원 한 자리씩을 차지했다. 이어지는 장면은 검정 배경화면에 배우들 소개 자막과 함께 ‘전선을 간다’라는 군가가 배경음악으로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전선을 간다’는 합창곡이 끝나갈 동안 관람객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넋 숨져간 그때 그 자리” 군가의 노랫말처럼 당시 쿠데타군을 저지하던 몇 명의 젊은 군인들은 쿠데타군에 의해서 사살당했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군가의 가사는 이렇게 끝맺음 된다. ‘전선을 간다.’라는 군가의 마지막 후렴구는 쿠데타를 저지하려 했지만, 패배한 그 전선으로 우리들을 나오라고 손짓한다. 관객들은 영화의 마지막 끝까지 대통령과 상층 군부관료들이 이탈해 갔던 그 전선을 지켰다.
영화가 끝나고 이어지는 장면과 합창곡으로 인해서 ‘서울의 봄’은 정치적이며 선동적인 영화가 되었다. 보수우익의 준동으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이 영화의 단체관람이 무산되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수많은 영화 관람평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 문재인도 “분노가 불의한 현실 바꾸는 힘 되길”를 바란다며 본인의 영화 관람평을 덧붙였다. 마치 그날의 대통령이 쿠데타의 합법성을 치장하기 위한 형식적 서류에 사후승인임을 소심하게 새겨 넣었던 것처럼 그도 현재의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자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정치 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검찰 집단의 개혁의 저항 과정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은(2021.6.18)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는 자신의 인품을 드러내 주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군부 상층관료들의 신사협정이 하나회 쿠데타군의 성공에 기여했던 것처럼 검찰집단의 발을 묶어 두지도 못했고, 오히려 검찰 집단의 정치적 힘이 강하다는 것과 집권 민주당의 나약함과 무능력을 대중적으로 각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검찰 집단의 수사와 기소권은 협치와 타협을 부르짖는 형식적 민주주의자들의 눈을 찔러대었고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다시 거리의 몫으로 돌려졌다. 그래서 ‘서울의 봄’ 영화는 오늘날 정치 검찰 집단에 맞서 싸우지도 못한 이들을 다시 지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관람객들에게 던지고 있다.

![[성명서]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요구 행정소송 승소를 환영한다](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photo_2025-06-12_16-34-16-455x300.jpg)

![[전선] 159호 11-5 11월 총궐기, 윤석열 퇴진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행진!](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순회투쟁1-양동규-455x3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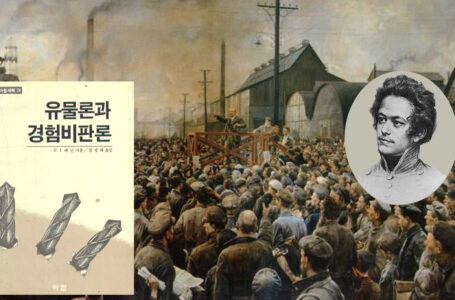

![[전선] 162호 2-3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김산-1-455x3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