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평등과 풍요의 변증법(11): 개념의 운동과 동일성 사유 비판
홍 승 용(현대사상연구소)
1.
변증법은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든 무궁무진한 속성을 지니고 무한한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 대상의 이러한 가변성과 복잡성에 비춰볼 때, 고정적 추상적 개념들을 통한 대상 인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인식이 전적으로 허위이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각 개인을 여타의 자연물이나 짐승들과 구분하여 모두 ‘인간’이라는 말로 묶어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다. 이로써 우리는 ‘인권’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며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나 사회적 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며 현실적 억압과 불평등에 맞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인간이라는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인간의 외연부터 명확하지 않다. 네안데르탈인이나 그 훨씬 앞인 500만 년 전쯤 지구상에 서식했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넓히지 않고 호모 사피엔스에 한정하더라도, 법적 사회적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 호모 사케르, 생물학적 기능을 심각하게 상실한 식물인간, SF에 흔히 등장하는 하이브리드나 사이보그 등등의 회색지대가 있다. 이러한 영역은 자연환경 변화나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이러한 영역을 떠나 장애인이나 소수자를 포함한 일반적 인간만을 고려하더라도,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답하기는 간단하지 않다. ‘정치적 동물’, ‘경제적 동물’, ‘사회적 동물’, ‘생각하는 동물’, ‘놀이하는 동물’, ‘감정의 동물’, ‘이성적 동물’, ‘도구를 만드는 동물’ 등의 규정들로 실제의 인간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유전자지도가 완성된다고 해서 인간의 복잡미묘한 특성이 모두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인간은 부단한 진화과정을 겪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인식도구들을 동원하여 가변적이고 무궁무진한 인간과 관련해 인식을 확대⋅심화하면서 그 결과들을 인간 개념에 연관짓고 이제까지의 인간 개념을 수정해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개념의 요소들인 ‘정치’나 ‘경제’ 등의 의미도 현실적 정치나 경제 자체의 변화와 이에 대한 인식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1]개념의 요소도 개념들이라는 점에서 데리다의 ‘기표들의 무한한 그물’이나 라캉의 ‘상징계’ 개념과 함께 관념론의 유혹에 끌릴 수도 있다. … Continue reading 따라서 인간 개념은 특정한 정의나 규정으로 고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왔고 변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 개념만 아니라 동물⋅정치⋅경제⋅사회⋅놀이⋅감정⋅이성⋅도구 등등 모든 개념에도 해당된다.
헤겔은 이러한 개념의 변화를 ‘개념의 운동’ 혹은 ‘개념의 노동’이라고 표현했다.(현상학38, 43, 65) 이와 관련해 레닌은 헤겔의 관념론적 외피를 제거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의 개념들은 비운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 상대방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개념은 살아 있는 생명을 반영하지 못한다.”(철학207) 헤겔은 개념의 이러한 변화가 우연한 추정⋅추론을 통한 진리의 논증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완전한 형성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현상학38) 이에 대해 레닌은 개념의 가변성이 주관적으로 적용되면 ‘절충주의 및 궤변’으로 되고, 객관적으로 적용되면 변증법으로, 즉 ‘세계의 끊임없는 발전에 대한 올바른 반영’으로 된다고 설명한다.(철학55) 또 그는 헤겔이 “사물(여러 현상, 세계, 자연)의 변증법을 개념의 변증법에서 천재적으로 추측하였다”고 평가한다.(철학150)
2.
변증법적 개념의 운동 혹은 개념의 변화와 풍부화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인식은 초보적이고 단조로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설혹 어떤 대상에 대해 상당히 본질적인 규정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머문다면 대상의 복잡다단한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제반 사물들과의 관계들을 파악해갈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자본의 개념을 ‘자기증식하는 화폐’라고 간단히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자본의 본질을 압축해서 말해준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당장 화폐와 증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이 요구에 부응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상품, 노동력 상품, 가치, 잉여가치, 잉여가치율, 가변자본, 불변자본, 착취, 노동일, 분업, 매뉴팩처, 기계와 공장, 축적과 집적, 시초축적, 유통과 회전, 경쟁, 유기적 구성, 이윤율, 공황, 평균이윤율 저하 경향, 물신주의, 지대 등등으로 이어지는 [자본론]의 전체 전개과정을 따라잡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자본론]을 통해 자본에 대한 인식이 완성되어 이제 개념과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절대지에 도달했으며 개념의 운동은 중단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변증법에 등을 돌리고 형이상학의 품에 안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 경우 [자본론]이 곳곳에 남겨 놓은 쟁점들에 대해 논쟁⋅비판⋅보완⋅수정하거나, [자본론]을 발판으로 현대 자본의 변화된 속성들을 합당하게 따라잡는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엥겔스는 맑스의 잉여가치론과 유물론적 역사 파악을 통해 사회주의가 과학으로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또한 다음과 같은 변증법적 요구를 제기한다. “사회주의가 과학으로 된 이후 그것을 과학으로서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 즉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F. 엥겔스: 「독일 농민전쟁」, [엥겔스의 독일 혁명사 연구], 박홍진 역, 아침 1988, 26쪽. 인용문에서 엥겔스가 ‘학습(lernen)’이 아닌 … Continue reading
우리는 흔히 자신이 받아들인 개념의 의미가 고정상태에 있어야 안심한다. 또 그러한 의미에 친숙해지면 어느새 그 개념과 그것의 대상을 동일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사유에 필요한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상 가운데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분들은 인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은 부분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면 그 개념은 그만큼 부적합해진다. 아도르노는 개념의 대상 가운데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을 ‘비동일자’라고 칭한다.그리고 개념과 개념으로 파악된 대상을 동일시하는 사유를 ‘동일성 사유’라고 규정하고, 동일성 사유의 허위와 폭력성을 비판한다. 하지만 그도 변증법적 관점에서 개념적 사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개념적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동일성 사유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아도르노는 “인식의 유토피아는 개념들을 통해 비개념적인 것을 밝히되 그것을 개념들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부정63-64) 그리고 “개념을 통해 개념을 넘어서려고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부정70) 이로써 아도르노는 개념적 사유의 문제점을 이유로 개념적 사유 자체를 거부하려 드는 포스트모던 이론가들과 달리, 개념적 사유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을 제시한 셈이다.[3]이와 관련한 P. 듀스의 평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포스트구조주의 내지 포스트모더니즘 사유와 일정한 공유점을 … Continue reading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유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대상이 어디에 속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알려 하고 더 이상 대상 자체에 대해 연구하지 않는 ‘위상학적 사유’[4]Th. W. Adorno: Kulturkritik und Gesellschaft 1(Prismen), Frankfurt/M. 1977, 29쪽. 혹은 ‘행정적 사유’를 지적한다. 행정적 사유는 “이른바 비합리성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관료적 질서 개념들 아래 종속시키고 합리성의 집합과 비합리성의 집합을 깨끗하게 서로 분리하는” 양자택일적 사유방식이다.(입문64) 이러한 사유방식은 가변적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단순하고 무자비한 결정으로 치닫기 쉽다. 예컨대 학생들을 우등생과 열등생이라는 틀 속에서만 보려고 하는 교사나, 고객을 구매력으로만 평가하는 상인, 노동자를 노동력으로만 계산하는 자본가 등에게는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의 희망⋅고통⋅잠재력 따위가 별 의미 없을 것이다. 그들 앞에서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고결한 요청 역시 공허한 덕담이 되어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다. 또한 위상학적 진영논리에 따라 사람들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어 놓는 데에 머물고 더 이상 사람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면, 적 진영에 있는 사람을 아군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찾기 어렵고 아군이 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간과하기 쉬울 것이다. 동일성 사유 내지 위상학적⋅행정적 사유는 특히 선택을 강요하는 가운데 자발적 선택에 불가피한 비판적 사유를 차단한다. 변증법적 사유는 동일성 사유와 그 변형들에 머물지 않고 대상의 무궁무진한 속성들과 관계들에 좀 더 적합해지고자 개념의 노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3.
개념의 운동⋅노동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아도르노는 변증법의 원칙도 변증법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계적 사유에 대립하는 변증법의 원칙도 ‘대상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기계적 사유로 돌아갈 수 있으며, ‘변증법 자체도 그 나름으로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으리라는 특허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입문90) 이러한 문제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변증법적 사유에는 ‘그 자체의 악용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입문101) 악용에 대한 경고는 맑스⋅엥겔스⋅레닌의 이론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독재 하에서는 해방운동의 주요 무기인 이들 이론의 묵살⋅추방⋅생매장이 악용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 점에서 특히 이들의 이론을 비판하는 현대의 이론들 역시 비판적⋅주체적으로 읽는 태도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맑스에 대한 비판을 무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자신이 맑스를 비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아도르노의 경고는 동일성 사유 내지 위상학적 사유에 대한 그의 비판에도 적용된다. 즉 위상학적 사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절대화하여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적대적 진영 구분을 흐리거나 부인하는 것도 비변증법적이다. 무한히 복잡다단한 현실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눈앞의 폭력과 불의에 대해 판정을 미루고 끝없이 개념의 노동에 매달릴 수는 없다. [저항의 미학]에서 페터 바이스가 묘사하는 나치 치하 반파쇼 투사들의 사고방식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사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대로 물러서버린다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진을 위해서 우리는 흑백 구분의 모델을 만들어냈다. 지지냐 거부냐, 찬성이냐 반대냐로만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5]P. 바이스: [저항의 미학1], 탁선미 역, 문학과지성 2016, 136쪽. 이 경우 반성의 절대화가 아니라 반성과 반성 중단의 실천적 관계가 부각되며, ‘우리’가 변증법을 묵살했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사태 자체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변증법의 척도는 관조적 인식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실천 속으로 이행하며, 이때 위상학적 사유 혹은 진영논리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변증법적이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위상학적 사유를 절대화하고 개념의 노동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흑백 구분 혹은 찬성 반대 속에는 이미 개념의 노동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결정은 심각한 손실과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방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적합한 결정의 강을 수없이 건너야 하지만, 결정의 시간들에 앞서 치밀하고 끈질긴 개념의 노동이 쌓일 만큼 쌓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노동자민중 누구라도 공유하며 검증하고 발전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조직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023. 5. 22.)
주
| ↑1 | 개념의 요소도 개념들이라는 점에서 데리다의 ‘기표들의 무한한 그물’이나 라캉의 ‘상징계’ 개념과 함께 관념론의 유혹에 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유물론은 개념이 개념으로 파악되는 비개념적인 것과 대조되는 위상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
|---|---|
| ↑2 | F. 엥겔스: 「독일 농민전쟁」, [엥겔스의 독일 혁명사 연구], 박홍진 역, 아침 1988, 26쪽. 인용문에서 엥겔스가 ‘학습(lernen)’이 아닌 ‘연구(studieren)’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있다. 자본독재 극복을 위한 전쟁에 의식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은 기존의 위대한 이론이나 사상을 받아들여 익숙하게 활용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주체적⋅적극적⋅비판적 연구를 통해 오늘의 실천적 과제에 좀 더 잘 부합되는 인식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
| ↑3 | 이와 관련한 P. 듀스의 평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포스트구조주의 내지 포스트모더니즘 사유와 일정한 공유점을 지니지만 단순히 그 선구자라고 할 수는 없다. P. Dews: Adorno, Poststructuralism and the Critique of Identity, in: S. Žižek(Ed.): Mapping Ideology, London/ New York 2012, 48쪽 참조. 무엇보다 아도르노는 개념을 통해 파악할 비개념적 대상과 개념을 구분하는 점에서 유물론을 고수한다. |
| ↑4 | Th. W. Adorno: Kulturkritik und Gesellschaft 1(Prismen), Frankfurt/M. 1977, 29쪽. |
| ↑5 | P. 바이스: [저항의 미학1], 탁선미 역, 문학과지성 2016, 136쪽. |


![[성명] 이재명 정부와 현대자동차의 반노동적 기술 숙명론을 강력히 규탄한다](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thumb-66fee4f3d6f05ebcb5efd2e6e1c84809_1769997943_2133_600x358-455x300.jpg)
![[성명]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요구 행정소송 승소를 환영한다](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photo_2025-06-12_16-34-16-455x300.jpg)
![[전선] 159호 11-5 11월 총궐기, 윤석열 퇴진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행진!](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순회투쟁1-양동규-455x3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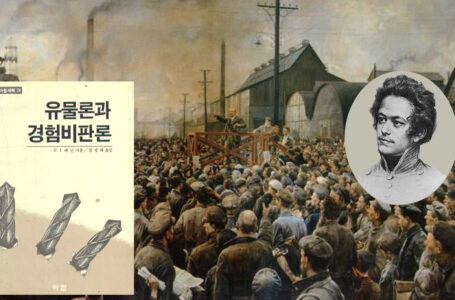
![[전선] 162호 2-3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김산-1-455x300.jpg)
5 Comments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сервисный центр по ремонту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с выездом на дом.
Мы предлагаем: ремонт крупногабаритной техники в москве
Наши мастера оперативно устранят неисправности вашего устройства в сервисе или с выездом на дом!
Thank you for your sharing. I am worried that I lack creative ideas. It is your article that makes me full of hope. Thank you. But, I have a question, can you help me?
Your point of view caught my eye and was very interesting. Thanks. I have a question for you.
Your article helped me a lot, is there any more related content? Thanks!
Your article helped me a lot, is there any more related content? Thanks! https://accounts.binance.com/fr/register?ref=DB40IT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