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술 ㅣ 민중의 소리 기자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들도 아닌 취급을 받으며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실습생들. 사회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견디길 요구받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에 있는 음료 공장에서 이민호 군이 사망했다.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선 홍정운 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라는 지시를 받고 잠수 작업 도중에 사망했다. 교육부가 지난 2020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현장실습생은 총 53건의 사고를 당했다. 공식 발표가 이 정도니 보고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화 <다음 소희>는 2017년 1월, 전주에서 대기업 통신회사의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져다. 열여덟 고등학생 ‘소희’(김시은)가 현장실습에 나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이를 조사하던 형사 ‘유진’(배두나)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소희’가 졸업을 앞두고 일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들은 현장실습생에게조차 실적에 대한 압박을 가하며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이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때로는 자존심을 지키고 때로는 친구를 위하던 ‘소희’는 모두가 전화기 너머 마주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는 곳에서 점차 말을 잃고, 끝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잠깐, ‘소희’와 스친 적 있는 형사 ‘유진’은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풀기로 맡게 된 이 사건을 쉽사리 마무리 짓지 못한다. 누구에게도 말해지지 않고,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이 고독이 낯설지 않아서 차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화 속 ‘유진’은 ‘소희’가 다녀갔던 곳을 거꾸로 되짚으며 사건을 풀어간다.
정주리 감독은 “‘소희’의 죽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다루었고, 그보다 더 큰 암담함으로 ‘유진’이 느꼈을 무력감을 다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음에 올 아이들을 걱정하는 ‘유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존재가 ‘소희’를 잃은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지 않고 이 다음을 생각하게 하는 희망이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청년노동자가 사회로 나가면서 만나는 불평등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은 바뀔 수 있을까?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토록 귀한 청년노동자에겐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만 넘쳐날 뿐이다.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청년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영화 <다음 소희>는 지금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소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성명] 이재명 정부와 현대자동차의 반노동적 기술 숙명론을 강력히 규탄한다](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thumb-66fee4f3d6f05ebcb5efd2e6e1c84809_1769997943_2133_600x358-455x300.jpg)
![[성명]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요구 행정소송 승소를 환영한다](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photo_2025-06-12_16-34-16-455x300.jpg)
![[전선] 159호 11-5 11월 총궐기, 윤석열 퇴진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행진!](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순회투쟁1-양동규-455x3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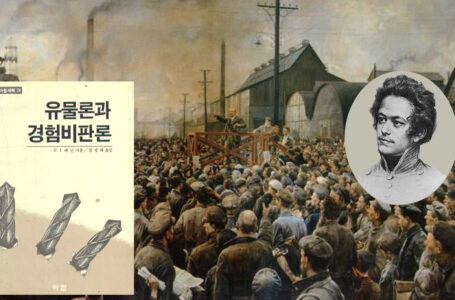
![[전선] 162호 2-3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https://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김산-1-455x300.jpg)
One Comment
Your article helped me a lot, is there any more related content? Thanks!